
L'Anneau de Nibelungen - La Walkyrie /R. Wagner
2013 Opera Bastille
'라인의 황금'을 보고 난 감상이 실망에 가까운 것이었기 때문인지, 이어지는 '발퀴레'에 대한 설렘은 반감에 반감을 거듭, 급기야 티켓을 끊고 나면 공연 전까지 의식적으로 몇 번은 하는 '귀에 붙이기(전체 감상)'는 커녕 1막만 겨우 찾아 듣고 마는 무성의로 한 달을 보냈다. 좋아하는 밴드의 공연 일정이 잡히면 열심히 떼창 준비를 하며 복습을 하듯, 장르를 불문하고 공연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라는 게 필요하다. 게다가 나는 바그네리안을 자청할 수 있는 수준도 못 되기 때문에 그런 밑준비 없이 가서는 못 따라가고 잠들게 뻔 했는데도 영 의욕이 생기질 않았다.
바그너의 음악극에 대한 정보를 찾다 보면 통상 쉽지 않다, 입문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마주하게 된다. 나도 어느 정도는 동감한다. 일단 오페라 팬이라면 상대적으로 익숙할 이탈리아 오페라의 형식 (레치타티보 + 아리아)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극을 따라가며 자연스레 강 약 중강 약 하는 식으로 조절하게 되는 집중의 리듬 타기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게다가 길기는 또 오지게 길어서, '라인의 황금'은 중간 휴식없이 두시간 반을 내리 달리고, '발키리'는 순 공연 시간만 세 시간 사십 오 분이다. 체력 좋은 독일 작곡가 답다.
하지만 그 어렵다는 바그너에 일단 덤비고 보는데는 이유가 있다. 아리아나 레치타티보가 없는 대신, 그의 음악극에는 특정 인물이나 장면을 상징하는 유도동기가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현대의 영화나 드라마 배경음악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런 음악적 장치가 아주 낯선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특정 선율을 기억하고 있으면 극을 따라가는데 도움이 되고, 특히 '발퀴레'는 많은 영화 감독, 음악 감독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던지라 직간접적인 매체 노출이 많았다. 의외로 '들으면 아는' 대목이 많은 작품인 것이다.
때문에 힘들기만 한 작품은 아니었다. 네시간에 달하는 공연 도중에 집중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졸리기도 했지만 나의 무성의함에 비하면 무척 친절한 공연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전편에서 느낀 실망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연출이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괜찮았다는 점도 도움이 되었다. 더 휘황찬란한 눈요기를 제공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아직 전 작품을 다 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운을 떼기는 조심스럽지만, 내가 본 링사이클 절반과 다른 작품까지 통틀어 느낀 바, 대부분의 경우 파리 오페라 나시오날의 연출은 분명 일정 수준 이상이지만 '화려하게, 더 화려하게 spectacular! spectacular!'를 지향하는 쪽은 아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파리의 오페라 신은 그 이미지에 비해 그리 화려하지도, 사치스럽지도 않다. 유럽 경기 침체가 당장은 문제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언제나 예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문화계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는 몇 안되는 국가들 가운데 형님 격이고 어느 정도 장사도 잘 하는 편이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각종 매체를 통해 자주 조명하는 것 처럼 문화산업과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모델이 아니다. 현대에 지어진 오페라 바스티유의 모토가 오페라의 대중화였듯 파리의 문화 예술계는 '더 많은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최상의 혜택'이 아닌 '더 많은 예술애호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물론 이곳에도 문화 예술을 향유하는 계층과 그들의 경제력 간의 끊을수 없는 연결고리가 존재한다. 허나 앞서 말한 프랑스 예술계의 모토는 더 많은 예술가들과 예술 애호가들을 끌어 안는 원동력임이 틀림없다.
그래서 한풀만 벗겨보면, 프랑스 문화계 종사자들은 언제나 예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성공에 성공을 거둔 호퍼의 그랑팔레 전시의 이면에는 예산확보를 위한 대관사업과 작품 대여료 인하를 위한 눈물겨운 네고가 있었다. 매 두 달에 한번 쯤 오페라 나시오날에서는 업커밍 공연들의 할인 혜택을 적은 우편물을 보내온다. 순수한 소비자인 나는 모른다. 나는 언제나 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내 사치스러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술소비와 더, 더, 더를 외치는 일은 관둘 때가 되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한다고 믿는 예술과, 그 예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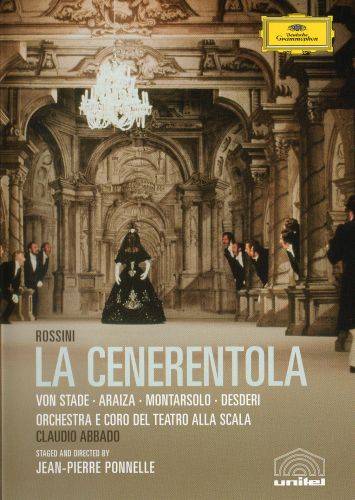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바그너 오페라는 보고싶다는 생각 했었지. 오페라가 익숙하지도 않고 크게 흥미를 갖기도 않는데,, 확실히 바그너는 다르게 느껴졌던 이유가 있었군 +_+) 탄호이저 그 관악연주가 생각난다. 역시 독일은 관악이라닌깐. 아니면 남성 성악. 쿠쿠쿠 ㅎㅎㅎ
그냥 들어도 포스가 남다르셔. 게다가 바그너는 보고 있으면 정말 관악 파트 포함 오케스트라 가수 다 너무 힘들것 같아서 ㅋㅋㅋ 결국 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체력싸움이라니까. 그리고 보면 인문예술 쪽 사람들 중에 바그네리안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것도 재밌어.
어 그렇구나. 인문예술인들이 좋아하는군. 왜지?? 음악사 까막눈 +0+음악계의 세쟌느 같은 사람인가? 모더니즘의 시작?? 궁금허다 갑자기
내가 본 인문계 바그네리안들이 모두 다 너무 고차원적인 사람들로 보여서 막 가늠하긴 어렵지만 좀 현학적인것에 끌리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은 한 적이 있어. 비평 좋아하고 말도 어렵게 하고 글도 어렵게 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