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달동안은 신상에 여러 심란한 일들이 일어나 차분히 책을 보기가 어려웠다.
일이 터지면 바로, 빠르게 대처해야만 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개중에는 아무리 발을 동동 굴러도, 시간을 들여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런 두어가지를 제외하면, 4월과 함께 다른 여러 일들은 수월히 지나온듯 싶다.
늘 월 초에는 지난 달 마지막날까지 마친 책들을 정리하고,
이번 달에 새로이 읽어들일 책들의 목록을 작성한다.
수첩을 들여다보니, 4월 한달 동안은 읽던 책들에, 읽으려던 책 몇 권을 더해
꽤 잡다한 목록을 만들어놓았다.
남이 들여다보면 흉볼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나는 즐거웠던 일곱 권.
1
사람풍경 - 김형경 심리 에세이
엄마와 여러번 이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이 책을 권해주신 것도 엄마였고 다 읽었다고 말씀드렸을때도, 참 좋아하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더냐고 물으셨다.
(아, 귀여운 엄마)
나는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을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그 싫은 마음 보다도,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해보려고 했다.
절대적일 수는 없더라도, '이해하려는 노력'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만큼은 그 무엇보다도 크고, 긍정적이다.
나는 적어도 이곳저곳 아픈곳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구나.
일상을 편안해 하고, 큰 상처없이 살아올 수 있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 사실 이렇게 살아오기가 의외로 힘들다는 것도 알았다.
'나의 세계'라는 것은, 스스로 아무리 애써 지켜도 다른 무언가에 의해 너무나 쉽게 흔들리게 마련이니.
다 자라기 전까지, 아니 지금까지도 나의 세계를 단단히 지켜주는 부모님께,
그리고 내게 상처주지 않고 스쳐간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했다.
그 외에도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들에게 뭔가 구체적인 힘이 되어줄 수 있을만한 한 권이었다.
자신 만이 알고 있는 어린 시절의 경험과 상처에 비추어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을테니까.
아이들을 보아도, 내 어린시절을 헤아려 보아도 일생에 부모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
이제는 부모의 영향을 받기보다도, 내가 부모가 된다면, 을 생각하는 나이인 만큼,
이 책이 무겁게 짚고 넘어간 이 '부모'라는 개념은 앞으로도 오래오래 고민해보아야 할 것 같다.
지나치게 개인적이다 싶은 에세이들이기도 하지만 그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독자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다.
그것이,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이유가 아닐까.
2
오주석의 한국의 美 특강 - 오주석
아주 재밌게 술술 읽어낸 그림 책.
얼마전에 서점에 갔다가 오주석씨의 새 책이 나와있는 걸 봤는데, 꽤 여러권 책을 내시는 분인것 같다.
책마다 하고 있는 이야기가 꽤 겹치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해서 한 두 세권만 잡아 읽으면
적당히, 넘치지 않는 유익한 공부가 될 듯 싶었다.
그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다들 그렇겠지만, 이 책엔 좋은 그림, 좋은 글귀가 많아 읽는 내내 즐거웠다.
다 읽고 난 다음 날, 바로 국립 중앙 박물관에 가서 이채 초상과 변상벽의 모계영자도를 보고 왔는데
비행기 타고 날아가지 않아도 이렇게 좋은, 그리고 사랑스러운 그림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았다.
책을 읽으며 가장 마음에 남았던 그림은 김홍도의 황묘롱접도였는데,
그 그림이 사랑스럽기도 하거니와, 어른의 생신잔치에 만수무강과 자손번성의 의미를 담아 주고받은 그림이라는데 의미가 있어 그도 한번 볼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있다. 참고로, 간송미술관에 있단다.
우리나라와 한국에서의 내 생활을 돌이켜 보기에도 좋은 책이었다.
아직은 내 자신속에 쌓인 것이 많지 않아 뭐라 이야기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내 안에 무엇을 쌓아나가야 하겠는가에 대한, 작고도 분명한 답을 주었다.
알아야, 알릴 수도 있는 법이다.
3
헤밍웨이, 파리에서 7년 - E.M. Hemingway
"Paris est une fête (파리는 축제다)"라는 제목으로, 프랑스에 머무르던 동안 읽고 싶어했던 책인데,
국내에서 우연히 발견해 읽게 되었다. 표지도 예쁘고, 들어가있는 사진들을 보니 꽤 공을 들인 모양인데
안타깝게도 번역이 썩 훌륭하지 않다. 여기저기서 문장이 자꾸 걸리는데다, 중간중간 등장하는 '초벌번역체'가
심하게 거슬려, 평소 페이퍼백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영어판을 찾아 읽으라고 권해주고 싶다.
물론 매우 훌륭한 불어 번역판도 있다.
생각보다 읽는데 시간이 들어 나중에는 안되겠다 싶어 이 책만 달랑 한 권 들고 비하인드에 가
녹차 라떼와 카푸치노를 마시며 다 읽었다. 그 날 책 말미에 헤밍웨이의 새로운 사랑에 분개한 나머지
친구 둘에게 전화까지해서 짜증을 낸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
헤밍웨이가 유럽에서 지내는 동안의 이야기를 읽으며 빠리가 무척이나 그리워졌다.
그가 교류했던 예술가들의 사적인 면모도 관심을 끌었는데,
무엇보다도 스콧 피츠제럴드와의 이야기를 담은 글을 읽으며 "위대한 개츠비"에서 묻어나는
피츠제럴드의 분위기를 단박에 이해하고 말았다. (그런 의미에서 개츠비 한번 더?)
아내 젤다와의 관계, 글을 쓰기 위해, 과거의 어느시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
젤다와 군인의 관계를 지켜본 피츠제럴드의 심경, 그 모든 분위기가 작품에 녹아있었다.
후에 헤밍웨이의 작품들을 더 읽게 된다면, 나는 이 책에서 먼저 만난 그를 더듬어 찾게 될까.
마무리가 해들리와의 결별이었던 점이,
그가 새로운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는 사실에 못내 울고싶을 만큼 속상했다.
Trackback Address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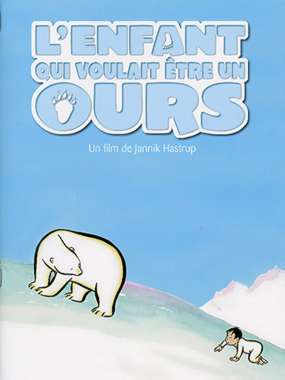

댓글을 달아 주세요